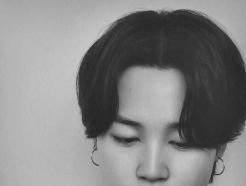|
| 사진=영화 '더 셰프' 스틸컷 |
영화를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음식 영화는 예쁘게 만든 음식의 비주얼이 좋고 무대인 레스토랑이 좋은 환경의 멋진 장소인 경우가 많아 일단 그림이 좋다. 여기에 주인공들이 하얀 옷을 입은 셰프들이라 금상첨화다.
음식과 요리에 관한 수많은 영화 중에서 '더 셰프'(Burnt, 2015)가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브래들리 쿠퍼가 셰프로 나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쿠퍼는 세 번째 미슐랭 스타를 따내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쓴다.
이 영화는 원래 제목이 '셰프'(Chef)였는데 존 파브로 감독의 '아메리칸 셰프'(Chef, 2015)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경했다. '아메리칸 셰프'는 왕년의 일급 셰프가 푸드트럭으로 아들과 함께 쿠바 샌드위치를 만들며 미국 전역을 도는 이야기다. 콜롬비아 출신의 매력적인 소피아 베르가라도 나온다.
 |
| 사진=영화 '사랑의 레시피' 스틸컷 |
'사랑의 레시피'(No Reservations, 2007)는 한 성격 하는 셰프 캐서린 제타-존스가 주인공인 영화다. 이 영화는 딱히 요리에 관한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형 식당과 주방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식당은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지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필두로 기업경영 일반에 적용되는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셰프의 직업이 참으로 고된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새벽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식재료를 직접 조달해야 한다. 시장 상인들과의 신뢰도 쌓여야 한다. 주방에서는 군대 못지않은 규율로 조직적이고 오차 없이 모든 일이 돌아가야 한다. 큰 식당에서는 한꺼번에 수십 가지의 요리를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다. 주문이 밀리면 안 된다. 또, 주방은 매우 위험한 곳이라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으니 조심하게 해야 한다. 스태프를 잘 훈련시키는 것도 큰일이다.
틈틈이 새 조리법을 공부해서 새 메뉴를 만들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스토랑의 경영진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메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시로 변하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맛에 관대해지기 때문에"(아론 에크하트의 대사) 잘 먹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기도 하고 항상 음식 맛을 보기 때문에 딱히 배가 고픈 적도 별로 없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손님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할 수는 없다. 또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요리라도 맛이 없는 법. 요즘은 밥투정을 인터넷에다 하는 세상이다. 블로그나 댓글에 음식에 대한 불평을 쏟아낸다. 캐서린 제타-존스는 자기 요리에 불평하는 손님은 모두 식당에서 쫓아내 버린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셰프가 몇이나 될까.
 |
| 사진='뮌헨' 스틸컷 |
그런데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이 셰프라면? 음식과 요리에 대한 영화는 아니지만 주인공 에릭 바나가 요리에 취미가 깊은 암살자로 나오는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뮌헨'(Munich, 2005)이다.
바나는 자신이 이끄는 암살단 멤버들에게 수시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이는 기특한 팀장이다. 주방용품점 쇼윈도를 들여다보는 취미도 있고 암살대상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랑스인들의 농장에 초대받아 가서 요리법도 한 수 배우고 진귀한 식품을 선물받기도 한다. 프랑스식 엉두옛과 부댕 누아르 곱창, 숯에 파묻어 보관한 프랑스식 순대에 누아르 쉘시르셰즈 치즈를 넣은 소시지.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따뚜이'(Ratatouille, 2007)에서는 천부적인 미각과 후각을 가진 주방의 쥐가 셰프다. 사실 셰프에게 미각과 후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다. 그걸 잃으면 끝이다. 이영애의 드라마 '대장금'(2003~2004)에서도 어릴 때부터 음식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빠짐없이 느낄 수 있는 절대미각을 가진 장금이("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일시적으로 그 미각을 잃어 고생하는 장면이 있다. 셰프들은 보험에라도 들어야 될 것 같다. '라따뚜이'에서는 '아라비아의 로렌스'(Lawrence of Arabia, 1962) 피터 오툴이 요리비평가의 목소리로 연기한다.
서양 음식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와인이다. 와인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다.
음식의 파트너로서의 와인, 즉, 주류로서의 와인에 대한 영화는 주로 다큐멘터리들이다. 와이너리의 출발과 성장 같은 주제를 다룬다. 마스터 소믈리에가 되는 과정을 담은 'SOMM'(2013)도 추천할 만하고 유명한 와인 소믈리에가 미각을 잃은 후 복면을 쓴 채 재기하는 'The Duel of Wine'(2015)도 볼 만하다. 글로벌 와인산업을 다룬 영화로는 러셀 크로우가 나레이션을 한 '와인을 향한 열정'(Red Obsession, 2013)이 있다.
 |
| 사진=영화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 포스터 |
와인 자체를 소재로 한 영화들 중 가장 수작은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The Secret of Santa Vittoria, 1969). 2차 대전 중 독일군은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산타 비토리아를 점령하고 마을에서 난 모든 와인을 탈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시장 안소니 퀸과 마을 사람들은 와인 백만 병을 옛 로마의 동굴에 숨긴다. 더 이상은 스포일러.
'이어 오브 더 코멧'(Year of the Comet, 1992)에서는 캐릭터들이 나폴레옹 황제의 봉인이 붙은 1811년산 와인을 두고 각축전을 벌인다. 대 혜성이 관측되었던 그 해는 유럽산 와인의 최고 빈티지로 통한다. 2011년에는 1811년산 와인(Château d’Yquem) 한 병이 7만5000파운드에 팔려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키아누 리브스의 '구름속의 산책'(A Walk in the Clouds, 1995), 폴 지아마티의 '사이드웨이'(Sideways, 2004) 다 재미있는 와인 소재 영화다. 리들리 스콧 감독, 러셀 크로우와 마리옹 꼬띠아르의 '어느 멋진 순간'(A Good Year, 2006)은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와이너리에서 낭만적인 이야기를 펼친다.
전 세계의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지금도 셰프들이 각자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위키는 '조리'(Cooking)를 음식을 준비하는 예술(art), 기술, 공예라고 정의한다. 조리가 예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요즘은 모든 여행의 초점이 음식과 그 음식을 찍은 사진이라고도 한다. 음식과 맛집을 빼면 여행에서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줄리아 로버츠처럼 '먹고 기도하고 사랑'(Eat Pray Love, 2010)할지어다. 셰프에게 감사하면서.
 |
| 사진=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스틸컷 |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