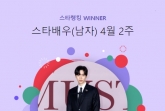|
| 두산 시절의 김현수(왼쪽부터)-민병헌-양의지. /사진=OSEN |
그런데 묘하게 닮았다. 왕조 구축 후 누리는 황금시대, 그리고 연이은 선수 유출에 따른 제국의 몰락. 2010년대 초중반 군림했던 '삼성 왕조'가 그랬다. 과연 두산은 어떨까.
◇하나둘씩 떠난 우승 주역들
NC 다이노스는 지난 11일 두산에서 뛰었던 포수 양의지와 계약금 60억원, 연봉 65억원 등 총액 125억원 규모의 4년 FA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포수 최초 100억원 시대를 연 것이다. 이는 롯데 이대호(4년 150억원)에 이어 역대 KBO리그에서 두 번째로 큰 FA 계약 규모다. 두산은 옵션을 포함해 4년 총액 120억원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NC의 강력한 영입 의지를 당해내지 못했다.
두산은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주축 선수들과 이별했다. 2013시즌이 끝난 뒤 내부 FA였던 내야수 최준석(당시 롯데행)을 비롯해 손시헌과 이종욱을 붙잡지 못했다. 손시헌은 30억원, 이종욱은 50억원을 각각 받고 NC로 향했다.
2015시즌 뒤에는 김현수가 미국으로 떠났고, 이듬 해에는 FA 3루수 이원석이 삼성(4년 27억원)으로 옮겼다. 지난해에는 역시 FA였던 민병헌이 유니폼을 롯데(4년 80억원)로 갈아입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서는 미국에서 복귀한 김현수를 영입하지 않았다. 결국 김현수는 한 지붕 라이벌 팀인 LG(4년 115억원)로 향했다.
물론 이별만 있었던 건 아니다. 두산은 2014년 시즌 뒤 롯데에서 뛰었던 장원준(4년 84억원)을 영입했으며, 2015년에는 내부 FA였던 오재원(4년 38억원), 2016년에는 김재호(4년 50억원)를 각각 눌러 앉히는 데 성공했다.
또 '화수분 야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배출, 좀처럼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에 2015년 부임한 김태형 감독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특유의 '허슬두' 팀 컬러를 살려 리그 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두 차례 우승(2015, 2016년)을 차지했다.
 |
| 이제는 NC의 안방마님이 된 양의지가 2018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은 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그랬던 두산이 이번엔 'FA 최대어' 양의지를 놓쳤다. 과거에도 있었던 결별이지만, 이번 양의지의 이적은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그가 포수이기 때문이다.
양의지는 현재 KBO리그에서 공수 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6년 두산에 입단, 2010년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9시즌 동안 풀 타임을 소화했다.
더욱이 훌륭한 포수의 존재는 곧 마운드의 상승세로 이어진다. 과거 함께했던 두산 동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산 라커룸에서 양의지가 차지하는 존재감은 꽤 컸다. 양의지가 아닌 다른 포수가 두산 마운드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도 관심사다.
양의지의 공백에 대해 두산 김태형 감독은 "그가 없다고 해서 정규시즌 1위 자리를 걱정하는 건 감독으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양의지가) 없으면 기존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나와 코칭스태프가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서 FA 유출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감독으로 부임할 당시 장원준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우승 감독도 될 수 있었다. 또 김재호와 오재원도 잡아줬다. 구단에서 (양)의지를 잡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
| 두산 김태형 감독 /사진=뉴시스 |
최근 두산의 행보를 보면,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건설했던 삼성이 떠오른다. 삼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5년에도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승(한국시리즈 준우승)하며 삼성 천하를 누렸다. 하지만 내부 FA 유출을 비롯해 트레이드와 방출, 은퇴 등으로 왕조 시절의 주역들이 하나둘씩 팀을 떠났다.
삼성은 2013년 정현욱이 LG로(4년 28억6000만원) 이적했고, 권혁(4년 32억원)과 배영수(3년 21억원)가 한화로 팀을 각각 옮겼다. 2016년 박석민이 NC(4년 96억원)로, 2017년 최형우(4년 100억원)와 차우찬(4년 95억원)이 각각 KIA와 LG에 새 둥지를 텄다.
여기에 오승환은 해외로 진출했고, 채태인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다. 이승엽도 은퇴했다. 안지만은 불미스러운 일로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임창용도 방출 통보를 받은 뒤 2016년 KIA와 계약했다. 류중일 감독 역시 2016시즌을 끝으로 삼성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주역들이 모두 떠나간 삼성은 2016, 2017년 9위를 차지한 뒤 2018년 6위로 3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했다.
KBO리그 왕조의 계보는 1980~90년대 해태 타이거즈에 이어 2000년대 초반 현대 유니콘스, 2000년대 후반 SK 와이번스, 2010년대 초중반 삼성으로 이어졌다. 늘 그래 왔듯이 언제나 '영원한 제국'은 없었다. 2010년대 중후반 왕조를 구축한 두산 베어스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